뭐 대충 팔십년대 말 쯤 한 소년이 어느 애매한 시골동네에 살고 있었다. 이 애매한 시골이라는 것, 요즘은 그런데까지 아파트 단지들이 밀고 들어가서 ‘청정조망’이 어쩌구 저쨌다는 분양광고가 나올 정도의 기괴한 시대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그 시절의 애매한 시골이라는 것은 중소도시 변두리에 멀찌감치 붙어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양계장도 있고 포도밭도 있는 시골임에는 분명하나 분명히 시내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동네를 말한다. 이야기의 배경이 뭐 한 쌍팔년 즈음임을 상기하면, 그 시절 시내버스의 운행 범위를 고려할 때, 아주 시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골 아니랄 것도 없는 뭐 그런 동네임을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골 애들이라고 하면 아무튼 또래 애들끼리 모여서 겨울에는 썰매타고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악귀처럼 소리지르고 노는, 지겨운 표현으로는 ‘천진난만’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론 그런 건 그저 텔레비전에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믿어버리는 도시 촌놈들의 생각일 뿐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골에도 도시민 못지 않게 조용한 사람도 많고 음울한 사람도 많다. 아니, 오히려 우울한 사람은 도시 이상으로 많지만 뭐 이른바 농촌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이야 언제나 인심좋고 여유로운 이들이 김회장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듯 하므로, 시골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런 동네도 어디 있는 모양이지, 하고 콧방귀를 뀔 뿐이다. 각박한 도시의 주민들은 군중속에서도 외롭다지만 시골 사람들은 핑계도 역설도 없이 그냥 외롭다.
아무튼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소년은 예의 외로운 녀석이었다. 집은 양계장을 했는데, 봄이면 집 근처 뚝방에 올라가 얼음 풀리는 강물을 보고 여름이면 뚝방에 올라가 우거진 나무를 보고 가을이면 뚝방에 올라가 시드는 풀을 보고 겨울이면 뚝방에 올라가 마른 풀에 불을 놓고 놀다가 양계장을 다 태워먹을 뻔 한 적도 있는 녀석이었다. 뚝방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집이 아주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 멀리 이쪽에 한 집, 저쪽에 두 집 정도로, 시야 내의 한 줄기 지방도로가 논 사이에서 나타났다가 밭 사이로 사라질 동안 사람이 내릴 만한 용무가 있는 곳이 없다시피 한 것이다. 물론 악귀처럼 떠들고 놀 또래도 없었다.
양계장이란 그런 곳인데, 닭이라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큰 소리가 나면 양계장 닭은 놀라서 죽어버린다. 녀석들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이는 직장에서 아무 비전없는 일만 매일 하다가, 어디서 쾅 하는 소리라도 나면 떼로 기절하고 그 중 다수가 깨어나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양계장은 일단 조용한 곳에 있게 마련인데, 웃기지도 않게, 막상 양계장 축사 그 자체는 너무 많은 닭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 모여있다보니 꽤 시끄럽다. 이 상황에서 닭이 시끄러워서 죽는 것은 닭 때문이기도 하고 닭 때문이 아니기도 하다.
하여간 이 소년은 이제 다니기 시작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뚝방에 올랐다. 형제도 있었던 모양이나 터울이 져서 어디 먼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닭이 놀라 죽을까봐 이 양계장에는 개도 없었던 관계로 소년은 혼자 놀았다.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놀자니 몇 대 없는 버스 탓에, 수업이 끝나면 버스 타고 집에 오기 바빠서 방과 후에 놀 만큼은 시간이 영 없다. 원래 조용했던 소년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조용하지 않을 기회가 없었던 관계로 여전히 조용했고, 결과적으로 조용한 아이가 되었다.
그의 세계는 단순하고 고요한 것으로서, 양 끝에 두 개의 둥그런 추가 달린 기다란 바벨 같은 것이 되었다. 한 편에는 다수의 애들이 있는 학교가 있었고, 다른 편에는 다수의 닭들이 있는 양계장이 있었다. 학교도 양계장도 시끄러운 곳임에는 분명하나 소년은 조용하였기에 그 소음들은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다. 그리고 두 개의 추를 관통하는 축이 통학 버스였다. 소년은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버스를 타고 양계장에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뚝방에 올라 풀을 태우다가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잤다. 버스는 학교와 집을 잇는다. 소년은 학교와 집을 오간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귀가를 위해 탄 버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탄 날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이 탄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도시민의 기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소년은 사람들을 헤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만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고 말았다. 겨우 내리는 문 앞까지 왔는데, 자동문은 모름지기 구식 유압장치가 모두 그러하듯 푸시시식 하는 폭음을 내며 닫히고 말았다. 소년의 눈 앞에서 문이 닫혔다.
그러면 내릴 수 없다.
내릴 수 없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집에 갈 수 없다. 집에 가는 버스가 집을 지나쳐간다. 기어이 버스는 달린다.
창 밖으로 논과 밭과 아뿔싸, 우리 양계장이 지나간다. 이제 난생 처음 보는 논과 밭과 전봇대가 지나가기 시작한다. 소년은 – 알 이유가 없었기에 – 알지 못했으나, 아니 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에 직면할 이유가 없었기에 항상 아는 채로 잊어왔던 사실을 이제 깨닫는다. 집 저편에도 길이 있고, 길은 끝이 없고, 따라서 버스는 끝없이 저 편으로 달릴 것이다.
끝없이. 엄마와 아버지와 닭을 뒤로 하고, 멀리.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강 건너? 산 너머? 서울? 북한? 미국? 달? 안드로메다?
소년은 난생 처음 느끼는 공포에 휩싸여 이미 산소가 희박해져감을 느낀다. 아아, 안돼. 엄마가 저녁을 해 놓았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밥을 먹을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을 것이다. 서울에 가면 코가 베인다. 북한에 가면 굶어 죽거나 북괴 승냥이들의 밥이 될 것이다. 미국에 가면 총을 맞을 것이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소년은 문자 그대로 사력을 다해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사람살려! 사람살려! 사람살려!
한편 버스기사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쿵쿵대는 소리에 모골이 송연하여 급히 차를 세웠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람살려’라고 외치는 섬뜩한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물론 진심으로, 거짓없는 마음을 담아 ‘사람살려’를 외치는 사람은 더더욱 얼마 되지 않는다.
기사가 웃었는지 화를 냈는지는 모를 일이나, 아무튼 문을 열어주었고, 소년은 울며, 불며, 약 10분을 걸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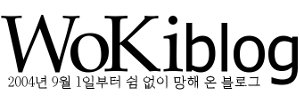
아 이거 누구 씨 얘기.
어쩌면 본인이 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게. 이 옛날이야기라는 글들, 어떤가? 읽을만 한가?
제법.
어, 이거 실화였나요? :D
“옛날이야기” 태그의 글들은 한 70%쯤 실화지. 아무튼 사건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