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화요일, 2010년 10월 26일에 한 은인의 부고를 들었다.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해 준 이는, 자기도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은인이 어제(그러니까 10월 25일) 자살했음을 내게 알렸고, 이 사건에 대해 슬퍼해야 마땅할 사람들을 모아 은인의 장례에 참석할 뜻을 비쳤다. 나 또한 슬퍼해야 마땅한 사람에 속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달리 끼워넣을 틈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장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나는 그러한 그의 이해에 고맙다고 답했으며, 어쨌거나 몸을 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한탄스럽다는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도 했다. 초상집 잘 다녀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내 대신 부의금 얼마라도 내 주고, 네 계좌번호 불러라’고 말했어야 옳지만, 당시 전화를 받고 생각나는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세간의 마땅한 행동거지를 반사적으로 떠올릴 만큼 노련하지 못했는데, 그 은인의 자살에 진심으로 당황했기 때문인 것 같다.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음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부의금을 전해달라고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나의 당황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일을 맞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죽은 은인에 대한 많은 기억과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거기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10월 25일을 기억해야 하며, 은인이 결국 자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여전히 당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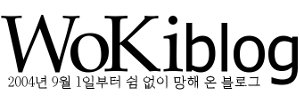
댓글 남기기